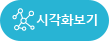| 항목 ID | GC60005380 |
|---|---|
| 한자 | 喪葬禮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 지역 | 광주광역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정혜정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사람이 사망한 후부터 매장까지 행하는 의례.
[개설]
상장례(喪葬禮)란 죽음에 따른 의례로 자손들이 중심이 된다.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시신을 매장하고, 사회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탈상까지의 여러 가지 의례를 말한다. 죽음을 현실로 확인하는 초종(初終)의 의례,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습과 염의 의례, 죽음을 애도하며 저승으로 보내는 발인과 매장 의례, 죽은 이의 혼을 달래는 탈상까지의 전 과정이 상장례에 포함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상장례는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부여 등지에서 순장(殉葬)의 풍속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에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순장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503년(지증왕 3)에 순장 금지령을 내렸다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신라시대 초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전후 신라는 매장법과 화장법을 사용하였다가 신라 말엽에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 매장 풍속이 성행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충렬왕 때 주자학이 들어온 후 불교식 상장례를 폐하고 『가례(家禮)』에 의한 상장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래도 민간에서는 불교 및 무속적인 상장례가 행하여졌다. 이러한 보수성과 유교식 상장례의 지나친 형식성과 복잡성 때문에, 유교적 상장례를 중심으로 하되 실용적이고 단순한 방향으로 상장례가 행해져 오게 되었다. 이후 기독교가 수용되자 일부 기독교식 상장례가 행하여지고, 근대에 와서는 상장례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또한 오늘날에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장례식장에서 장의사가 상장례를 담당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현재 집에서 상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없다.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상여 대신 영구차를 이용한다. 상복 역시 남자의 경우 검은 양복과 삼베 건, 여자는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는다. 선영(先塋)이 있는 경우 선영에 매장을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공동묘지에 모시거나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고 있다.
[절차]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성안마을에서 행해졌던 전통적인 상장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종례(初終禮)는 사람이 운명하고 습(襲)을 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임종(臨終)→수시(收屍)→고복(皐復)→사자상(使者床)→발상(發喪)→상주(喪主)→호상(護喪)→부고(訃告)의 절차이다. 다음은 습염(襲殮)으로 습은 망인을 목욕시킨 후에 수의로 갈아입힌다. 수의를 입힌 후 반함(飯含)을 하고 염을 한다. 염은 습한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렴과 이를 입관하는 대렴이 있다. 입관이 끝나면 널 위에 남자는 '모관모공지구(某貫某公之柩)', 여자는 '모봉모씨지구(某封某氏之柩)'라 쓰거나 단순히 관의 상하만 기록하기도 한다. 왼새끼를 꼬아서 일곱 매듭으로 관을 묶고 병풍을 친다.
입관 후 문상 온 손님을 위해 혼백을 만들어 영좌에 안치한 제청을 만든다. 상주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통건과 소복을 벗고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성복을 하고 제청이 마련되면 조문객을 맞는다. 이때 조문객은 혼백상 앞에서 먼저 곡을 한 후 재배하고 생인들과 맞절을 한다. 성복 후 발인 때까지 관을 모셔두는 곳을 빈소(殯所)라고 한다. 빈소에는 상주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씩 진짓상을 차려 드리는데, 이를 상식(上食)이라 한다.
다음은 유해가 장지를 향해 집을 떠나는 발인의 절차이다. 대개 관을 밖으로 내온 후 발인제를 지낸다. 방안에서 관을 내는 절차는 여섯 사람이 당목으로 결관한 관을 들고 관머리로 방의 네 구석을 찧으면서 '복, 복, 복' 하고 소리친 후 관머리부터 밖으로 내온다. 관을 내올 때 문턱 위에 놓인 바가지를 깨고 문턱에 톱으로 'X' 자 표시를 하고 나온다. 상여를 메고 시신을 묻는 과정에도 여러 의례가 이루어진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나설 때 행렬은 명정, 공포, 만지지, 혼백상, 설소리꾼, 상여, 상주, 우복친지, 조객의 순이다. 상여는 망인이 즐겨 가던 곳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기 전 하직하는 인사로 '노제(路祭)'를 지낸다. '거릿제'라고도 하며 보통 마을회관 공터에서 지낸다.
매장하는 날 아침 지관과 산일을 할 사람들은 매장 준비를 한다. 묘의 방향을 잡고 산일을 시작하기 전 산신제를 지낸다. 상여가 도착하고 하관을 하는데, 이때 살(殺)이 있는 사람은 하관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하관 후 봉분을 만들고 평토제를 지낸 다음 집으로 돌아온다. 상여꾼들이 돌아올 때는 상여 나간 길이 아닌 곳으로 온다.
다음은 흉제(凶祭)로 매장 후부터 길제(吉祭)까지의 제사를 말한다. 혼백을 산에서 반혼하여 지내는 반혼제에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의미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상주는 일상으로 복귀한다. 옛날에는 묘 곁에 움막을 짓고 시묘하였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상주는 매사에 근신하며 망인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도리로 여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망자가 평상시 쓰던 방 등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려 지방(紙榜)을 붙인다. 상에는 간단한 찬을 준비하여 하루에 세 번 식사를 올린다. 이렇게 상이 차려진 곳을 상방이라고 하며,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 또한 상식(上食)이라고 한다. 이것은 평시의 식사와 다름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상 때까지 드린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곡을 하는데, 이를 삭망전(朔望奠)이라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상장례는 죽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무사히 보내는 과정이다. 죽은 이의 혼을 위하고 육신을 매장하고 소상, 대상, 탈상에 이르는 3년 동안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동시에 남은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의 질서를 수립하게 된다.
- 『민속지』(광주광역시, 1990)
-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문학아카데미, 1994)
- 나경수 외, 『광주 충효동 성안마을 사람들의 삶과 앎』(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7)
- 표인주, 『남도민속의 이해』(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